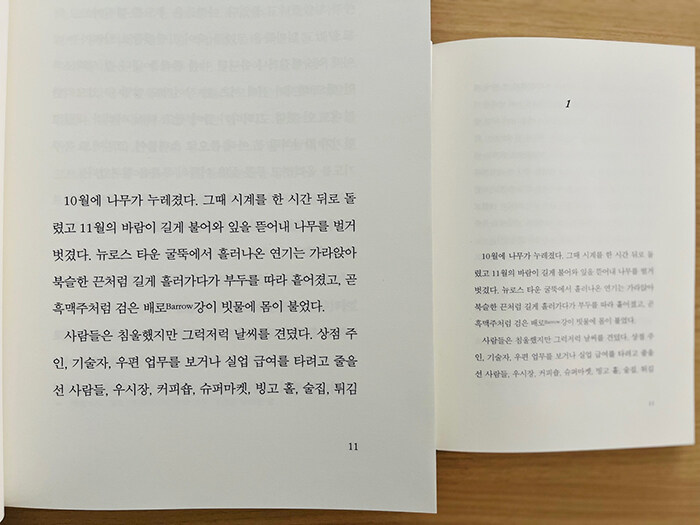출판사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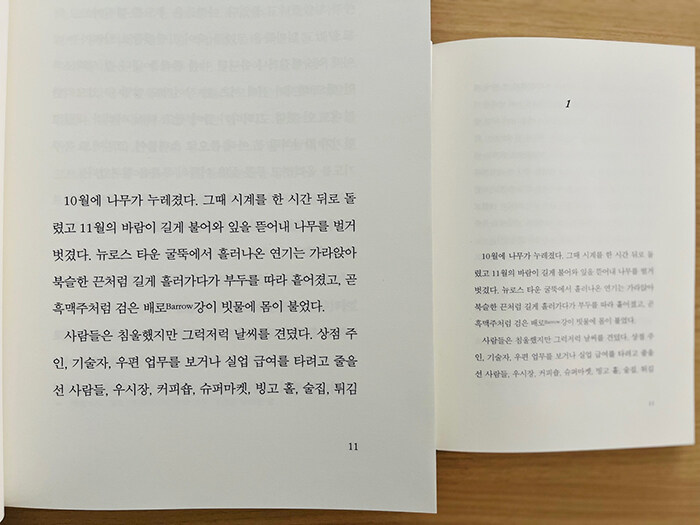
나는 떠날 거야. 인생에서 가장 차분하게 내린 결정이었다. 아빠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게 싫다. 심지어 나마저. 다행히 노름꾼인 아빠의 눈초리를 피해 틈틈이 모아둔 약간의 돈, 그래봐야 세 달 정도의 숙소비가 수중에 있었다.
다 태우고 떠나야 하는데 베개가 타지 않았다. 덮고 의지할 게 사라진 내게 남은 건 머리를 기댈 엄마뿐이라서 그런 걸까?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. 일단 엄마를 찾으려면 여기만 아니면 됐다. 떠날 이유로 이보다 강한 동기와 이유는 없었다. 되돌아가더라도 스쳐가는 황폐한 여행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. 찾아서 물어야 한다. 난 엄마의 과거니까. 놀라운 미래였어야 할 내가 숨겨야 할 과거로 변질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니까.
_「가출」
“책 넘기는 소리가 꼭 날갯짓 소리 같지 않아요?”
나는 박수 치며 맞다고 응수했다.
“어디로든 데려가 줄 것만 같은 날갯소리요.”
선생님이 테이블 위에 책을 보고는 손바닥을 세워 모양을 따라 만들었고 나도 같이 손바닥을 세웠다.
“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집 같아요.”
그러면서 두꺼운 책 두 권을 계산대에 올렸다. 책을 선물로 받은 건 평생 처음이었다. 『전쟁과 평화』와 『모비딕』, 그것도 두꺼운 양장본이었다. 무척 어려워 보였지만 선물로 받은 책이라 안 읽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. 첫 장을 펼쳐볼 엄두도 안 났다. 다음 날, 겨우 세 장을 읽었을 때쯤 선생님이 오셨고 손 사인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다. 어색해서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. 합장에서 손바닥을 뗀 손 모양이 산이나 지붕, 책을 세워둔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. 늘 비슷한 시간에 방문하는 선생님의 표정은 아픈 얼굴과 외로운 얼굴 그 사이에 있었다. 무표정과 슬픈 표정 언저리에 걸쳐 있는.
_「가출」
작가 소개
지은이 : 케이시
장편소설 『네 번의 노크』를 출간했다. 도서 출간 전 영상화 판권 계약을 먼저 했다. 이름을 못 외우는 탓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는 소설과 에세이를 쓴다. 목수, 농부, 어부를 꿈꾼다. 글 쓸 때만큼은 문장을 살찌워 출하하는 방목 생태 축산업자의 자아를 가진다. 도축과 가공, 도소매 유통을 출판사 몫으로 떠넘길 때면 섭섭 시원하다. 키우는 즐거움만 잔뜩 누린 것이 자못 죄송하다. 최종 소비자의 책상에 오를 땐 심심한 건강식보단 맵거나 달콤한 맛으로 남기를 원한다.
![[큰글자도서] 메이드 인 라이브러리 이미지](https://image.imilkbook.com/HanBook/Simg/cover/946/363365946.jpg)